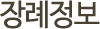
장례 행사시
유용한 정보를 모아 제공합니다.


세제지구(歲製之具)라고도 한다. 유교에 따른 의식을 치르기 전 한국의 옛 수의가 어떠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나,
사람이 죽어서 입는 옷이니만큼 당시의 성장(盛裝)으로써 수의를 삼았을 것으로 추측된다.
수의는 주로 윤달에 마련하는데 하루에 완성하여야 하고 완성된 것은 좀이 쓸지 않게 담뱃잎이나 박하 잎을 옷 사이에 두어 보관하며,
칠월 칠석에 거풍하였다. 조선시대에는 관(冠) • 혼(婚) • 상{喪) • 제(祭)의 사례(四禮)를 유교, 특히 <주자가례(朱子家禮)>에
준하여 거행하였다. 수의는 <사례편람(四禮便覽)> 상례조(喪禮條)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.
남자는 복건(幅巾)·망건(網巾)·심의(深衣) 또는 단령(團領)·답(褡:소매 없는 氅衣) 또는 직령(直領)·대(帶:條帶)·과두(裹頭:배와
허리를 싸는 것), 포오(袍襖:中赤莫)와 같은 설의[褻衣], 한삼(汗衫:몸에 다는 小衫, 속칭 적삼)·고(袴)·단고(單袴:속바지)·
소대(小帶:허리띠)·늑백(勒帛:속칭 행전)·말(襪)·구(屨)·엄(掩:裹首)·충이(充耳)·멱목(幎目:覆面)·악수(握手:裹手)를 갖추었다.
여자의 경우는, 사(纚)·심의 또는 단의(褖衣) 또는 원삼(圓衫)·장오자(長襖子:속칭 長衣)·대·삼자(衫子:속칭 唐衣)·
포오(속칭 저고리)·소삼(小衫:적삼)·과두(裹肚:속칭 요대)·상(裳)·고·단고·말·채혜(彩鞋)·엄·충이·명목·악수 등이다.
위의 수의는 관습화하여 오늘날에도 특수한 종교의식에 의한 염습 외에는 이를 따르며, 후박(厚薄)이 있을 뿐이다.
윤달수의
윤달은 일반적으로 전통 태음력(太陰曆])에서 19년 동안 7번의 윤달을 넣어 책력(冊曆)과 계절(季節)를 일치시켰는데가진수의란?
격식을 갖춘 수의라는 뜻으로 수의 복을 포함한 부속 류 일체를 말한다.평수의란?
가진 수의에서 장매 천금(이불)과, 지금(요) 도포(남) 또는 원삼(여)이 제외된 수의로서 옛날 평민 이하 하류계층의 사람들이세(細)란?
올의 가늘고 굵음을 뜻하며 1세는 80가닥의 올을 말한다.수의가 큰 이유는?
수의는 일반의류에 비해 매우 크게 만드는데 그 이유는 고인(故人) 에게 수의를 입힐 때 고인을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가진 수의를 만들기 위한 삼베의 양?
남자용과 여자용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, 대략 195자 {쪽34~37cm)정도가 소요된다.연간 생산되는 수의 량
수의의 주 원사인 마는 대마초의 생산을 금지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에 의해 마의 생산은 제한이 되고 있고, 그로 인하여 수의 생산량도